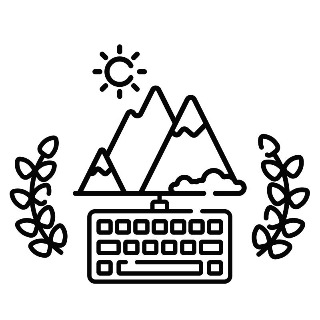가면의 윤곽을 따라가며 (혹은 자정을 넘으면 풀리는 마법), 유정민 <내가 잘할게>
가면의 윤곽을 따라가며 (혹은 자정을 넘으면 풀리는 마법)
유정민 <내가 잘할게> 가변크기, 2018.9.13 - 9.27
글 콘노 유키
어떤 사람이 실제 가면을 썼을 때, 보는 사람은 가려진 부분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눈도 살짝 보이고 옆모습도 확인할 수 있고 가려주지 못하는 정보량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면은 변신을 위한 도구보다 어떤 것을 숨기기 위한 도구에 더 가깝다. 사실 가면의 ‘가(假)’자는 ‘거짓’이라는 뜻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임시’의 뜻도 포함한다. ‘임시적인 거짓 얼굴’이라 이해할 때 가면의 능력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 즉 가면은 완벽하게 현실의 모습을 바꿀 필요없이 ‘잠깐 가리기’만 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가 어떤 (본인이 아닌) 역할을 수행할 때와 달리, 가면은 그 자리에서 그 모습이 이미 가짜임이 드러나고 만다. 이처럼 완벽하게 다른 사람으로 변신‘한’ 모습이 아닌, 어설프게나마 변신‘하려고’ 나타날 때, 가면이 가려주는 진실과 정체를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있을까? 가면이 깨져 현실로 소환되는 그때, 대상이 어떻게 ‘다르게’ 보일까?
가변크기에서 지난 9월에 열린 유정민의 개인전 <내가 잘할게>는 작가 본인이 소유하는 작은 장난감이나 물건을 작품의 소재로 다룬다. 전시장 내부에 파란 색 천이 깔렸고 군도처럼 몇 개 알록달록한 색깔로 구조물이 세워졌다. 그보다 작은 오브제들이 이 구조물 위나 주변에 여러 개 배치되어 있다. 이 오브제들은 이전 모습을 미약하게나마 짐작할 수 있으나, 작가가 서문에 ‘말없는’이라 표현한 바와 같이 원래 기능을 상실하고 예술작품이라는 다른 모습으로 등장한다. 예컨대 치약에 점토를 입히거나(‘너는 웃지를 않아’) 칫솔과 연필을 결합한 뒤에 점토를 붙여 빌딩을 만들었고(‘엘리베이터 고장 ~우리집은 49층~’), 캐릭터 인형은 다른 색깔로 덮혀 태양이 된다(‘어제도 만나지 못한 친구’). 이는 오브제 뿐만이 아니다. 작품의 지지체 역할을 하는 큰 구조물 또한 작가가 늘 쓰던 물건들로 만들어졌다. 작가 스스로 ‘섬’이라 부르는 이 구조물은 원래 책이나 의자, 박스였고 이 요소들이 여러 색깔의 천으로 가려져 일종의 무대를 만든다. 점토로 덮히고 천이 씌어진 이 대상들은 윤곽을 통해 원래 모습을 유추하게 만든다.
‘너는 웃지를 않아’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작품뿐만 아니라 공간 전체를 천으로 가려 무대처럼 만들었다. 그런데 이 무대는 어떤 가짜가 덧씌워진 결과로만 노출되어 원래 모습을 완벽하게 가려주지 못하고 있다. 작품에서 인형의 일부가 보이고, 그 형태를 통해 물건이 파악되듯, 전시장 바닥 또한 전체를 천으로 덮지 못하기에 실제 공간을 보여준다. 작가가 “내가 잘할게”하면서 어떤 감정을 전달하는 인형들, 그들이 서게 되는 지지체는 예술적 공간이라는 무대 안에서 현실의 전시 공간을 꾸미는 요소들로 '투입'되어 거기서 일종의 배우역할을 한다. 하지만 무대 만들기와 안의 배우들은 현실과 격리된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현실의 모습을 물체의 윤곽에 담는다. 말하자면 여기서 천과 점토로 덮인 대상들은 현실적인 요건을 간직하고 있다. ‘섬’은 원래 좌대가 아니었고 점토를 붙여 제작된 오브제도 원래는 다른 물품(치약, 인형, 책 등등)이었다. 그 사실이 전체 무대공간에 이미 윤곽 지어져 있다. 이 공간에서 어설픈 분장은 지지체와 오브제들의 관계를 애매하게 하는 것을 넘어 무효화한다. 왜냐하면 그 공간에서 양자 모두 현실의 윤곽을 간직하기 때문이다. 오브제, 심지어 ‘섬’까지 받치고 있는 것은 좌대가 아니라 현실의 어떠한 물건들이다.
‘쓰러지기 전까진 포도나무인 줄 몰랐다’
이번 작업과 비교하여 2012년 작품인 ‘저는 당당해요’를 떠올릴 수 있다. 작가는 대학교 졸업전시 작품심사 전날까지 작품을 제작하지 못했는데, 이 작업은 그 이유를 설명(변명)하기 위해 도구를 만들었고 심사받는 자리에서 실제로 착용하여 제작 못했던 이유를 설명한 퍼포먼스이다. 이와 비슷하게 이번 전시의 <내가 잘할게>라는 말 또한 마치 부모가 아이한테 건네는 말과 같이, 나의 현실적인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좀 더 힘을 내려는 말처럼 들린다. 이처럼 두 작업 모두 현실 속 부족함과 더 나음 사이에서 진동하는데, 전자의 경우 현실에 대비하는 도구로서 작품이 만들어졌다면, 후자의 경우는 작품 자체에 이미 현실이 내포되어 있다. 현실에 이미 둘러싸여 있다면, 덮어버리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이번 전시에서 탈‘바꿈’으로 반드시 연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형태 지어진 천이나 작품에 현실의 그림자를 간직한 채, 탈을 여전히 쓰고 있는 결과로만 나타난다. 그렇다면 아직 깨지지 않은 저 망치는 무엇일까? 작품 ’쓰러지기 전까진 포도나무인 줄 몰랐다’에서 작가는 진짜 망치를 전시장에 갖다 놓지도 아예 하나의 새로운 망치를 제작해내지도 않았다. 오히려 망치의 가면을 망치에 씌웠다고 볼 수 있다. 점토로 덮힌 망치가 깨져 어떤 것을 부수는 도구로 드러났을 때, 마치 신데렐라 이야기에서 자정을 넘자마자 (어설픈) 마법이 풀리듯, 망치는 다시 현실로 완전히 돌아간다. 관람자는 전시공간에서 완벽하게 이상적인 모습으로 덮은 무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가면의 윤곽을 통해 망치의 가면이 벗겨질 때, 섬이 와해되고 전시공간 이 탈-무대화될 때를 내다본다.
이미지 제공: 유정민
'text'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18 전시 결산 - 콘노 유키 (0) | 2019.02.26 |
|---|---|
| 2018 전시 결산 - 이상엽 (0) | 2019.02.26 |
| 우리가 딛고 설 수 없는 것들 사이에서, 유영진의 두 전시 (1) | 2019.01.16 |
| 2018 광주비엔날레 <이제 오늘이 있을 것이다> 파빌리온 프로젝트 (0) | 2019.01.16 |
| '별자리'로 그은 선, 2018 광주비엔날레 <상상된 경계들> (0) | 2019.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