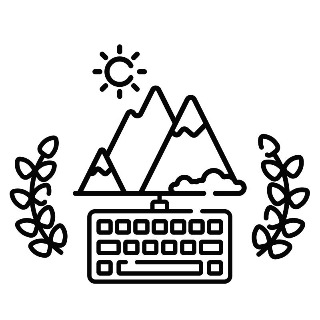'별자리'로 그은 선, 2018 광주비엔날레 <상상된 경계들>
‘별자리’로 그은 선
2018 광주비엔날레 <상상된 경계들> 중 GB커미션(아피찻퐁 위라세타쿤의 '별자리'), 국군광주병원, 2018. 9. 7 - 11.11
글 이상엽
1980~2018
그러한 시도는 늘 있어 왔다.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과 장소의 재경험을 이끄는 시도들, 역사성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이야기와 작품들. 오늘날 활자,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통로삼아 재구현된 역사적 순간들은 그 매체가 무엇이 되었든 그 결과물이 수용자인 관객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공명하기를 기대받는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든 관객이 가지게 될 경험은 ‘간접 경험’이며, 그 방점은 대체로 ‘경험’보다는 ‘간접’에 찍히곤 한다. 관객은 그때 그곳에 있지 않았으므로. 역사적 사건을 다시금 구현하는 시도들은 대개 사건의 지독한 실태를 정제 없이 보여주거나, 역사를 미화하고 신화화하는 가운데 늘 과도하거나 모자라게 된다. 그렇다면 역사적 순간을 지금 여기 다시 재생해올 때, 이를테면 관람자의 방독면을 억지로 벗겨 유독 가스를 들이마시게 하지 않으면서 또 한편으로 역사의 가장자리에 무겁고 큼지막한 금색 액자를 씌우지 않고서 어떻게 불러올 수 있을까?
이를 위해 아피찻퐁 위라세타쿤(Apichatpong Weerasethakul)의 ‘별자리’를 불러와 본다. 2018 광주비엔날레 <상상된 경계들>에서 아피찻퐁 위라세타쿤은 (구)국군광주병원 내 후생 시설로 기능하던 공간에 ‘별자리’라는 작업을 선보인다.1 별자리, 실제로 그것은 하늘 위에 흩어진 점과 같은 개개의 별들을 연결해 큰곰이나 양 같은 실제 형상을 그려내는 상상의 선이다. 작가는 그 선을 조금 당겨와 옛 병원 건물 안에 풀어 보인다. 오랜 기간 방치된 사이에 곳곳이 무너져 내려앉은 천장과 그 아래 수북이 쌓인 먼지, 유리 파편을 머금고 앙상한 뼈대로만 남은 이 노쇠한 공간에서 작가는 관람자로 하여금 상상의 살을 덧붙여가며 공간이 작동하던 과거를 그려보도록 한다. 위라세타쿤의 ‘별자리’는 <상상된 경계들>이라는 전시의 제목처럼 1980년과 2018년의 시간을 잇고, 기능이 멈춘 채 오래도록 출입이 제한된 공간과 그 바깥을 이으며, 관람객과 과거 병원에 머물렀을 사람들 사이에 상상의 다리를 놓는다.
그렇다면 위라세타쿤이 이 경계들을 잇는 방식은 이전의 화생방 훈련이나 역사를 금색 액자 속에 넣는 방식과 어떻게 다른가? 전시가 이루어지는 국군광주병원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부상당한 시민들이 치료받으며, 그 사이에도 끝없는 감시와 검문이 이루어졌던 역사적 사건의 상처를 머금은 장소이다. 아피찻퐁 위라세타쿤은 국군병원의 후생시설로 사용되던 공간 전체를 전시 공간으로 삼고 당구장, 이발소, 공연장 등을 포함한 각 공간에 스며들듯 개입해 들어간다. 그는 공간를 변형하거나 개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먼지, 파편, 재 틈으로 작업을 이루는 사물들을 조심스럽게 안착시킨다. 그는 작업을 돋보이게 하는 방법보다 가능한 한 공간이 온전히 드러나는 데 최적화된 환경을 구성했다. 그 때문인지 공간을 거니는 관객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작업이고 또 작업이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워진다. 관객이 봉착한 이런 난처함은 곧 공간 그 자체를 하나의 작업으로 보아도 무방한 지점에 이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무엇도 작업이 아닌 것처럼 느끼도록 한다. 아피찻퐁 위라세타쿤이 작품으로서 충분히 실현가능한 각종 인위적인 스펙타클을 이 공간에 투사하지 않은 점은 그가 1980년 광주가 가진 역사성을 내포한 이 공간을 존중하는 태도로 볼 수 있다. 작가는 5.18민주화운동을 묘사하거나 설명하는 용도로써 어떠한 사물도 가져 오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도 그 당시를 재현하지 않지만 이 장소에 발을 들인 어느 누구든 그때를 상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억지로 관객의 방독면을 벗기는 일2이 아닐 뿐더러, 역사성을 미화하고 그 주변을 장식하는 일도 아니다.
유령들
아피찻퐁 위라세타쿤은 이곳으로 또 무엇을 불러들이는가? ‘불러들인다’는 말은 그가 지금껏 선보인 일련의 영화들과 잘 들어맞는다. 그는 영화에 곧잘 ‘유령’을 불러들였다. <열대병>(2004)에 등장하는 병사는 어두운 정글을 헤매며 호랑이 유령을 좇고, <엉클 분미>(2010)에서는 주인공의 아내가 유령으로 현현하고, <메콩 호텔>(2012)은 메콩강을 둘러싼 오랜 전설 중 하나인 ‘폽’이라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가 유령을 소환하는 맥락은 영화 속 주인공들의 개별 소서사와 정치적 상황을 내포하는 거대서사를 잇는 요소로써 희생자 혹은 이야기를 움직이는 매개체로 등장한다. 그가 앞선 영화들에서 불러들인 유령은 인간에게 위협을 가하는 폭력적인 존재로서 등장하기보다 개인의 기억과 상처의 발화를 이끄는 존재로 나타난다. 위라세타쿤이 그의 영화에서 주로 불러오던 유령적 요소는 이번 국군병원에서 미술의 이름으로 펼친 ‘별자리’에서도 드러난다. 한동안 사람의 출입이 없었던 폐쇄된 공간 그러나 과거 그 장소를 사용한 흔적이 곳곳에 스며 있는 공간, 역사적인 아픔과 직결된 상처의 공간, 이 공간에 발을 들인 관객은 정적과 어둠 속에서 미세한 움직임과 소리, 빛 같은 것들을 마주하게 된다. 바닥 한 구석 손 한뼘 정도의 공간 안에서 이리저리 조금씩 움직이는 당구공, 창 틈과 천장 사이 희미하게 스미는 빛,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오르내리는 스크린에 인쇄된 광주 배경의 풍경화들, 저멀리 벽면에 투사된 형체가 모호한 영상 등 작업 ‘별자리’의 일부로 존재감을 내뿜는 각 사물들은 실제 별자리를 이루는 개개의 별처럼 병원 곳곳에 흩어져 관객의 발걸음을 다음 공간으로 이동시키는 동선을 만든다. 이는 앞서 위라세타쿤이 영화에 불러낸 유령들과 유사하게 관객을 위협하기보다 과거 그 장소를 점유했던 영혼들이 가진 슬픔과 그들의 존재를 과잉되지 않지만 명확하게 인지시키는 방법을 취한다.
제약과 조건: pm 5:30 / pm 7:00
하루 중 ‘별자리’를 관람할 수 있는 시간대를 오후 5시 30분과 7시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저녁에서 밤으로 향하는 이 시간 사이에는 어둠이 짙게 내려 앉는다. 짙게 깔린 흑암 속에서만 밝히 드러나는 별이 가진 조건처럼, 작가가 ‘별자리’에 수놓은 효과들이 발하는 빛은 공간이 어두워짐에 따라 점차 밝게 드러난다. 또한 저녁 5시 반에 관찰 가능했던 형상들은 어둠이 내려앉은 7시가 되면 그 형상을 가늠할 수 없고, 몇 시간 전 기억을 더듬어 상상해야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어쩌면 1980년의 역사를 기억해내는 일 또한 이미 어둠이 드리워져 희미해진 시간 가운데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겨내며 그 때를 가늠해보는 일일지도 모른다. 이 어둠으로 우리가 상상의 지형을 넓혀 갈지 혹은 더 좁히게 될지 확언할 수 없지만, 그건 희뿌연 유독가스가 넘실거리는 어둠의 방에서 배회하는 화생방 훈련 격의 역사 소환 방식에서 걷는 걸음과는 다를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 어둠은 보리스 그로이스(Boris Groys)가 『In the Flow』(2016)에서 언급한 카지미르 말레비치(Kazimir Severinovich Malevich)의 작품 ‘검은 사각형(The Black Square)’(1915)을 떠올리게 한다. 그로이스는 말레비치의 새까만 재와 같은 표면을 가진 회화 ‘검은 사각형’이 가지는 함의를 매 시대/사회/문화가 끝을 맺을 때 그 죽음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물질이 모두 타고 마지막에 남는 잿더미(ashes)로 본다. 그로이스는 미술의 운명 또한 다른 모든 사물과 시대가 맞는 운명과 다르지 않다고 보며, 이를 가장 잘 시각화한 급진적 파괴의 이미지로 ‘검은 사각형’을 가져온다. 그의 말에 따르면 사물의 진실을 드러내는 작품은 그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게 아닌 그것과 운명을 함께하는 것이었다. 이는 아피찻퐁 위라세타쿤이 ‘별자리’에서 물리적으로 노쇠하여 기능적 죽음에 이른 역사적 슬픔이 어린 공간과 그곳에 켜켜이 깔린 먼지나 어둠, 재를 덮거나 치우지 않고 그 가운데 함께 놓이며 그것들과 운명을 공유하는 방식과 닮았다. “정치적 상황을 예술적으로 착취하지 않고 제대로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3 고민해 온 작가가 역사성을 구현하는 방식은 이러하다. 이러한 방식은 “광주민주화운동의 상처를 문화예술로 승화하고자”4한다는 전시가 향하는 커다란 포부 사이로 구멍을 하나 낸다.
- 태국의 영화 감독으로 잘 알려진 아피찻퐁 위라세타쿤은 2018 광주비엔날레 <상상된 경계들>에서 GB커미션으로 다른 세 작가(아드리안 비샤르 로하스, 마이크 넬슨, 카데르 아티아)와 더불어 전시에 참여했다. 그는 (구)국군광주병원의 전체 공간을 답사 후 병원 내 후생시설로 만들어진 공간을 선택해 장소 특정적 설치 작업을 선보였다. [본문으로]
- '방독면을 벗기는 일'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쓰였지만, 물리적으로 노쇠한 동시에 오랜 기간 폐쇄된 건물이 갖는 유해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유의하는 차원에서 실제로 관객에게는 마스크가 제공된다. 전시 기간 중 마스크를 억지로 벗기는 일은 그 누구에게도 발생하지 않는다. [본문으로]
- 두산아트센터 [컨템포러리 토크] 아피찻퐁 위라세타쿤과 박찬경과의 대담 중 발췌. [본문으로]
- 2018 광주비엔날레 GB커미션 설명 중 발췌. [본문으로]
'text'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우리가 딛고 설 수 없는 것들 사이에서, 유영진의 두 전시 (1) | 2019.01.16 |
|---|---|
| 2018 광주비엔날레 <이제 오늘이 있을 것이다> 파빌리온 프로젝트 (0) | 2019.01.16 |
| 빛 바랜 시선: 사진을 보기에 대해서, 김보리 <사진찍어줄게요: 오프라인> (0) | 2018.09.05 |
| 몸 바깥의 몸, 김윤익 <포유류 대장간> (0) | 2018.09.03 |
| 재료로서의 이미지, 방법론으로서의 프로그램 : 선셋밸리 이미지 시뮬레이터 (0) | 2018.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