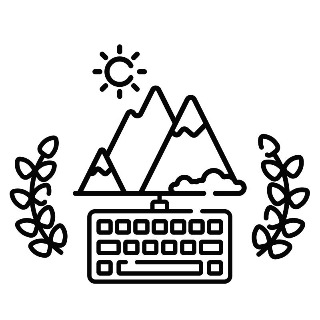재료로서의 이미지, 방법론으로서의 프로그램 : 선셋밸리 이미지 시뮬레이터
재료로서의 이미지, 방법론으로서의 프로그램 : 선셋밸리 이미지 시뮬레이터
<샘플북 쇼케이스>, 소쇼룸, 2018.4.20-22
<폴리곤 플래시 OBT>, 인사미술공간, 2018. 5.18-6.16
<미술세계> 2018년 7월호 게재
글 이기원
디지털 사진의 사진의 기본값으로 자리잡으면서, ‘이미지’ 역시 관념적으로 떠올리는 ‘심상’에서 ‘디지털 이미지’를 지칭하는 표현에 가까워졌다. 이에 맞춰 우리의 일상에서 액정화면을 지지체로 삼는 디지털 이미지를 통해 이뤄지는 시각적 경험의 비중은 크게 올라갔고, 당연히 디지털 이미지의 위상도 변화했다. 특히 어떤 창작물도 창작자가 보고, 느끼고, 연구한 것에 기반한다는 전제에서, 오늘날의 시각예술가들에게 디지털 이미지는 작품의 구상 과정에서 수집됐다 다시 흩어지는 참고자료나 완성된 작품을 기록하는 도판의 차원을 넘어, 밑그림처럼 작품의 표면 아래에 깔려 있거나 그것의 외피가 되는 등 그 자체로 작품의 재료 또는 재료 이상의 비중을 갖는다. 나아가 디지털 이미지와 그것이 소비되는 방식을 어떻게 변환/재가공해 작품으로 내보낼(Export) 것인지는 오히려 최종 결과물로서의 작품의 존재보다 중요해졌다. 때때로 전시장에 놓인 작품은 어떤 작업의 완결된 총체적 결과물이 아니라 용도와 맥락에 맞춰 물리적/개념적으로 ‘부분출력’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지난 4월 초, 이주리 작가가 구상하고, 정시우 큐레이터가 제작을 도운 ‘선셋밸리 이미지 시뮬레이터’(이하 선셋밸리)는 웹사이트로 신청한 이들에게 일주일간 결과물 이미지를 전송했던 ‘선셋밸리 이미지 수신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는 이주리 작가가 디지털 이미지의 속성을 자신의 회화적 방법론에 적용한 디지털 드로잉 시리즈 ‘Sunset Valley’를 기반으로 하여 레이어가 되는 요소를 재조합해 이미지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이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같이 온전히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 작동하는 도구라기 보단, 작품의 제작 과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어떤 규칙이나 조건에 가깝다. 사용자는 재료로 쓰일 이미지를 벡터(Vector) 형식으로 입력하고, 이것이 선셋밸리의 캔버스 안에서 어떤 색상과 위치, 크기, 기울기, 투명도 등을 가질 것인지 최소/최댓값을 설정한다. 시뮬레이터는 사용자가 입력한 범위 안에서 재료들을 무작위로 배치해 결과물을 출력한다. 물론 컴퓨터에게는 ‘무작위'라는 정렬 기준 역시 하나의 규칙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보긴 어렵고, 오히려 이 과정은 자동기술법의 일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실 선셋밸리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이를 통해 출력된 이미지 역시 벡터 형식을 유지한다는 것인데, 화질 저하와 같은 손상 없이 얼마든지 확대/변형/재가공될 수 있고, 매체나 지지체를 가리지 않고 여러 방식으로도 출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선셋밸리의 디지털 이미지는 종이와 같은 2차원 평면 뿐 아니라 두께와 부피를 가진 3차원의 무엇을 지지체로 삼을 수 있다.
<샘플북 쇼케이스> 전시전경
이주리는 선셋밸리의 설계자이자, 첫 번째 테스트 사용자가 되어 자신의 벡터 드로잉을 재료로 매체에 구애받지 않는 작업물을 생산했다. 소쇼룸에서 진행된 <샘플북 쇼케이스>에서 작가는 시뮬레이터에서 생산된 결과물을 시트지로 뽑아 공간 벽면에 붙이거나, 네온사인을 제작하고, 각각의 레이어를 다른 방식으로 출력해 하나의 지지체에 중첩시키는 등 여러 방식으로 재료가 되는 디지털 이미지를 스크린 바깥에 구현하며 선셋밸리를 소개했다. 여기서의 캔버스는 원근법 체계 아래 놓이는 창문도, 모더니즘이 오브제화시킨 ‘평면’도 아닌, 무한히 레이어를 쌓을 수 있는 가상의 2차원 정도로 보이지만, 이는 도출된 이미지를 어떤 방식으로 출력하고 구현하느냐에 따라 3차원의 공간으로도 확장될 수 있다.
지난 5월 열린 <폴리곤 플래시 OBT>에서 전시를 기획한 정시우는 레벨 디자이너로서 각기 다른 매체를 다뤄온 3명의 작가(김동희, 권영찬, 문이삭)를 선셋밸리 사용자-오픈 베타 테스터-로 섭외해 시뮬레이터의 결과값이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 실험했다. 문이삭 작가는 선셋밸리를 통해 도출된 이미지를 인사미술공간의 축척에 대입하고 각기 다른 시점에서 생성된 이미지를 겹쳐내 하나의 구조물처럼 보이는 두께를 가진 이미지를 출력했고, 참여작가이자 디자이너로 참여한 권영찬은 3차원의 전시장을 2차원의 도면으로 바라보고 시뮬레이터에서 무작위로 도출된 위치값에 맞춰 전시를 구성하는 텍스트들을 배치했다. 반면 김동희 작가는 선셋밸리를 구동시켜 그 결과값을 따랐다기 보다는 특정 범주에서 랜덤한 결과값을 내보이는 선셋밸리의 작동방식 자체를 전유해 무작위로 생성된 동선을 따라 전시장 도면을 유영하는 영상작업을 선보였다. 이런 측면에서 <폴리곤 플래시 OBT>의 전시장은 하나의 도면이자 물리적인 지지체로써 선셋밸리 어플리케이션이 인스톨된 (일시적) 저장장치처럼 보인다. 문이삭의 사물-덩어리들과 권영찬의 텍스트-벡터 이미지가 배치/부착되는 과정과 김동희의 영상에서 나타나는 동선은 애초부터 휴먼스케일로써 관람객의 시점은 배제되고, 철저히 선셋밸리의 시점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덕분에 관객이 인사미술공간의 3개 층을 둘러보는 과정은 선셋밸리 사용자의 경험이 아니라, 오히려 시뮬레이터 내부에서 내보내지기(Export)를 기다리는 레이어의 역할을 부여받는 것에 가깝다.
이처럼 이주리가 선셋밸리를 통해 시도한 것이 자신의 작업을 실험군으로 대입해 액정화면 속 래스터(Raster) 이미지로서의 평면회화가 어떻게 오프라인에서 변환/재가공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이었다면, 정시우는 <폴리곤 플래시 OBT>에서 전시 제목의 OBT(Open Beta Test)가 의미하는 것처럼, 실험군을 입체와 벡터 이미지로 확장시켜 온-오프라인이 동기화되는 지점을 관찰한다. 이런 지점에서 선셋밸리를 거쳐 스크린 밖에서 구현/출력된 결과물들은 그 자체로 작품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 결과물들이 선셋밸리라는 프로토콜을 온전히 대표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오히려 페이퍼 아키텍처(Paper Architecture)처럼 실제로 지어지지 않은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선셋밸리에서 생성된 데이터는 건축 설계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최종 결과물로서의 작품보다 더 넓은 의미로 해석되고, 그때 그때의 용도와 제한조건에 맞게 결과물의 형태를 조절할 수 있게 되면서 액정화면과 현실세계 사이를 오갈 수 있게 된다.
<폴리곤 플래시 OBT> 전시 전경
'text'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빛 바랜 시선: 사진을 보기에 대해서, 김보리 <사진찍어줄게요: 오프라인> (0) | 2018.09.05 |
|---|---|
| 몸 바깥의 몸, 김윤익 <포유류 대장간> (0) | 2018.09.03 |
| 전시들, <Exhibition of Exhibition of Exhibition> (0) | 2018.06.27 |
| 갤러리 공간에 대한 사고 실험, <포인트 카운터 포인트> (0) | 2018.06.25 |
| 시점으로 조형하기, <포인트 카운터 포인트> (0) | 2018.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