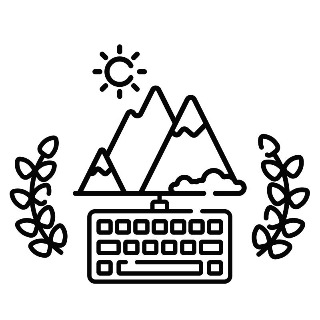박하사탕으로 알아보고 나서―하얀 마름모꼴 이후, <박하사탕>

*이 글은 <박하사탕>도록에 실릴 예정입니다.
박하사탕으로 알아보고 나서―하얀 마름모꼴 이후
<박하사탕>, 별관, 2019.2.7-2.21
글 콘노 유키
박하사탕을 인식하려면 시각적인 경험에만 의존할 수 없다. 말하자면 체험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의 시각적인 인식과 연결된다. 겉보기에 보석처럼 보이는 박하사탕은 아예 처음 봤을 때, 먹을 수 있고 입에 넣으면 없어지는 사탕이라는 생각을 누가할 수 있을까? 지금이야 직접적 혹은 간접적 경험―먹었거나 “이게 사탕이래!”라고 들었거나―을 통해 그것을 박하사탕으로 인식할지 몰라도, 겉보기에는 마치 보석 같이 생겼다. 박하사탕을 ‘박하사탕으로’ 인식하려면 그 ‘보석 닮은 것’을 입 안에 넣어야 한다. 먹다가 깨지고 점점 없어지는 사탕은 애초의 모습으로 온전히 있질 못한다. 변형과 소멸로 다가가는 과정에서 시각적으로 비친 보석은 점점 원래 모습을 잃어간다. 이미 입 안에는 보석처럼 고귀하거나 세련된 물건이 아닌, ‘박하사탕’이 들어가 있다.
이번 전시제목인 ‘박하사탕’은 필자의 생각에 적어도 순수함과 거리가 멀다.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작업하는 동기가―영화 <박하사탕>의 제목을 가지고 온 것과 같이―순수할지언정 결과물을 보면 순수하지 않은 작품, 바꿔 말하면 ‘순수 조각’이 아닌 것들이다. 전시장에 들어가면 찌그러든 작품과 일상에서 가벼워 보이는 물건을 단단하게 만든 두 종류의 작업을 볼 수 있다. 이것들은 적어도 봤을 때 기존 조각(=순수 조각)과 모양새도 작품에서 오는 느낌도 다르다. 기획자 서문에도 나와 있듯, 이번 기획은 조각의 기존범주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도, 문장 중간에서 ‘오브제’라는 말로 (아마도 의도치 않게) 일부분 대체되듯, 조각이라는 하나의 범주가 오늘날 정의하기 어렵고 모호해진 상황을 보여준다. 필자가 당장 여기서 조각의 범주를 <박하사탕>에서 선보이던 두 작가의 작업을 가지고 새로운 정의를 내리지 못하지만, 이번 전시를 통해서 조각작품의 시간성―박하사탕의 인식 과정처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시간성이라는 말은 조각에서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 설치(작업)의 규모까지 전개되었을 때 관람자에게 신체적으로 동반되는―그 유명한 리처드 세라(Richard Serra)의 <기울어진 호>(1981)처럼―시간성이 있고, 다른 한편 대지미술로 불리는 몇개의 작업에서 물성과 환경의 관계가 그렇듯이 작품자체의 모양이 시간을 거쳐 화하는 경우도 있다. <박하사탕>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두 작품의 각 특징들, 그리고 전시방법에서 시간성을 확인할 수 있다. 때리고 힘을 받은 것(맞은 것)―원인과 결과로 나온 사태, 그리고 올려진 것과 안 올려진 것―전시가 된 혹은 전시 준비중인 상태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간성이란 어떤 단채널 영상 이미지가 재생되는 것과 다르다. 오히려 작가 둘의 작업 사이의 관계나 전시공간의 배치방법을 통해 감지되는 단계에 의한 시간성이다. 힘을 받았거나 혹은 작품이 올려져 있거나 좌대쪽에 숨어 있는 것과 같이, 양극단의 상태를 통해서 과정을 암시한다.


한편 작품자체에 동반되는 시간성이 존재한다. 이를 기념비적인 것들―미래를 내다보는 혹은 미래가 이미 도착한 것―이라 하자. 필자가 앞으로 살펴볼 시간성은 기념비적 시간성이다. 이번 전시에서 홍기하의 작업은 미래를 내다보는 조각이라 할 수 있고, 반면 김문기의 작업은 미래가 이미 도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홍기하의 작업에서 조형물은 주로 일상에서 보는 소재들을 단단한 돌로 만든 작업이다. 예컨대 ‘약 125년이 지나면 이 댓글 섹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어있을 것이고 이 지구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로 채워져있을 것이다. 그냥 변기에 앉아서 생각해볼 거리. 미래의 당신들에게 명복을 빕니다.’라는 인스타그램 유머 포스팅의 문장과 아스키 아트(ASCII Art)처럼 보이는, 생각하는 인물의 모습을 문자로 이미지화한 온라인 상의 비물질적인 대상이나, 석고보드 텍스나 배너 거치대로 쓰이는 물통처럼 일상에서 마주보는 좌대와 같은 바탕들이다(도판1). 여기서 작가가 다루는 소재는 지금 시점에서는 일상에서 흔히 쓰이고 원래 조각이 아닌 것들이다. 작가는 그 대상을 외주 제작을 통해 무거운 재료로 보여준다. 여기서 시간성은 미래에 남을 수 있게 현재의 순간을 ‘미리’ 박제하여 단단한 물질로 정착시킨다. “플라스틱이 돌보다 오래 더 가는데?”라는 반론은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작가는 궁극적으로 스치듯이 보는 대상을, 그렇게 경험하는 데에 무게중심을 부여하여 미래를 약속한다. 그의 작업에서 기념비성은 이미 사라졌거나 지나간 기억의 지표로 기능하기보다, 곧 사라질지도 모르는 대상을 조형물로 기록하여 미래로 향하는 시간을 약속한다. 반면 김문기의 작업은 연약하게 비춰져 기념비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도판2). 그런데 기념비가 일종의 시간적 지속을 위해 미래로 나아가는 일에 봉사한다면 찌그러진 형태는 이미 형태자체가 어떤 힘을 받았다는 결과로서 드러난다. 그의 작업은 어떤 힘을 받아 이미 구겨진 상태로 있으며 결과물로서 과거를 간직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김문기의 작업 또한 기념비적이다. 앞서 홍기하의 작업이 (미래로) 남기기를 위한 것이라면 후자는 남겨진 것들에 더 가깝다.
이와 같은 작품의 두 성격은 전시에 포함된 두 텍스트(작가 노트식의 편지)에서 마찬가지로 드러난다. 홍기하는 편지의 형식으로, 반면 김문기는 SNS 채팅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처럼 그때 그때마다 상황과 내용이 짧게 나타난다. 김문기의 짤막한 텍스트와 홍기하의 편지의 시간성, 전자는 오래 기억될 일 없이 흩어지는 문자 메시지처럼, 후자는 먼 미래에 누가 읽을지도 모르는 형식으로 보관된다. 두 편지의 성격은 작가의 작업 성격과 일치된다. 과거를 보존하느냐 미래를 향해 기록하느냐에 따른 두 작업은 각기 다른 기념비의 시간성을 작품에 내포한다. 회고적(retrospective) 역사보존이 예견적인 것으로 전환되면서 새로 짓는 건축물과 보존건축의 시간차를 ‘0년’이라는 말로 설명한 렘 쿨하스(Rem Koolhaas)의 주장①을 거쳐 말하자면, 전시장 안에서 두 작가의 작업은 과거의 보존과 미래를 향한 보존하는 태도가 거의 ‘영점’에 도달한 기념비라 말할 수 있다. 로버트 스미드슨(Robert Smithson)이 댄 플레빈(Dan Flavin)의 <타틀린을 위한 7번째 기념비>을 (전형적인) 시간축에서 떨어져 나온 ‘즉각적인 기념비(instant monuments)’라 부르는 것과 달리②, 두 작가의 작업은 과거의 지속과 미래를 예견한 지속(적 상태)의 화살표를 사이에 두고 거의 영점에 도달한―아킬레스와 거북이 이야기처럼―현재에 나타난다. 각각(의) 시간을 지속시키기 위해 과거의 현재화와 미래를 향한 보존 태도가 조형물에 반영된다. 그 영점의 시간성을 관람객은 전시장에서 경험할 수 있다. 작품을 보면서 관객들은 원래 모습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보석 닮은 하얀 마름모꼴’을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박하사탕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다. 박하사탕을 깨질 수도 녹아내릴 수도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두 작가의 작업에서 조형물 자체에 이미 도래할 미래와 이미 벌어진 상태로서 과거를 간직하고 있다는 걸 파악할 수 있다. 조각 작업 뿐만 아니라 ‘조각’에 대한 관람자의 인식에 이제 순수함은 자리잡지 못한다. 적어도 현재란 그런 시간이다―과거가 오고 곧 미래로 가는 화살표(→→) 사이, 과거라는 시간의 힘을 받고 또 미래로 뻗어가는 영점에 두 작가의 작업은 위치된다.
*사진 제공 : ⓒ안부
① Rem Koolhaas, CRONOCAOS, Log No. 21 (Winter 2011), pp. 119-123 참조
② Robert Smithson, Entropy and the New Monuments, Artforum (June 1966) 참조
'text'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부서지기 쉽지만 무너지지 않는, 권세정 <아그네스 부서지기 쉬운 바닥> (0) | 2019.06.28 |
|---|---|
| 더하기 더하기 빼기, 정지현 <다목적 헨리> (0) | 2019.06.28 |
| 향이 나는 푸른 맛을 만지는 손, WTM decoration & boma <Rebercca လက် and The Cost> (0) | 2019.06.27 |
| 벽|벽지: 페인팅과 오브제 사이, 혹은 오브제 위에서, 이미정 <The Gold Terrace> (0) | 2019.03.03 |
| 2018년 결산 : 한 해의 시작은 봄부터 아니겠어요 ( ͡° ͜ʖ ͡°) (0) | 2019.0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