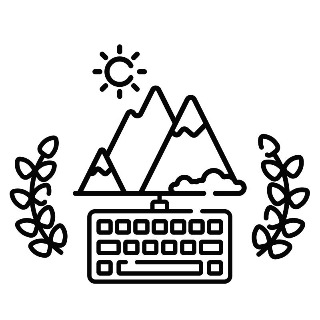도쿄특집 03 - 당신이 오른손 장갑을 뒤집을 때, 당신은 틀림없이 왼손의 장갑을 얻는다, 치바 마사야의 두 전시
당신이 오른손 장갑을 뒤집을 때, 당신은 틀림없이 왼손의 장갑을 얻는다
<MAM Collection 006: Materials and Boundaries - Handiwirman Saputra + Chiba Masaya>, 모리미술관, 2017.11.18 - 2018.4.1
<ShugoArts Show>, 슈고아츠, 2018.2.10 - 4.7
글 이상엽
뒤집힌 장갑과 캔버스
조르주 디디 위베르만(Georges Didi-Huberman)은 그의 글 『우리가 보는 것, 우리를 응시하는 것』에서 이미지를 설명하며 장갑의 비유를 가져온다. “당신이 오른손의 장갑을 뒤집을 때, 당신은 틀림없이 왼손의 장갑을 얻는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장갑이다. 그것은 늘 같은 것에 사용되며, 그것은 체계를 바꾸기보다는 오히려 체계를 완성하고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오른손용으로 만들어진 장갑 한 짝은 오른손을 덮기 위해 제작된 본 목적과 용도와는 무관하게 서로 대칭하는 양손이 가진 닮음의 속성을 따라 오른손용 장갑을 뒤집으면 왼손에 꼭 맞는 왼손용 장갑을 얻게 된다. 실밥이 노출된 채로 뒤집힌 이 장갑은 뒤집기 전과 다를 바 없이 여전히 장갑의 형태를 가지며, 장갑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런데 뒤집어 얻은 이 왼손 장갑은 그 형태가 가시화되었을 때 기이한 측면을 발견하게끔 한다. 보통 장갑의 안쪽 면은 바깥쪽 면이 장갑의 외양으로 잘 드러나고 또 그 기능을 잘 감당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허술한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실과 실 사이가 조밀하게 엮이고, 엮인 실들이 풀리지 않게 몇 번의 매듭이 지어진다. 앞서 뒤집기로 얻은 왼손 장갑의 엉기성기 노출된 실밥이 주는 기이함은 바로 여기에서 발견된다. 보통 장갑의 안쪽 실밥은 노출될 일이 없고, 그 모양새 자체도 노출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지지 않았기에, 뒤집힌 장갑 형태가 막상 눈앞에 드러났을 때 기이하게 보이는 것이다.
안이 바깥으로 뒤집힌 장갑처럼 뒤집힌 그림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뒤집힌 장갑의 노출된 실밥 너머 상상의 타래를 타고 캔버스 천으로 옮겨 가서, 캔버스 뒷면에서 앞면을 지지하고 있을 또 다른 종류의 실밥을 떠올려 본다. 그림이 그림일 수 있도록 그림 뒷면을 구성하는 작업을 위한 각종 레퍼런스들과 작업 공간의 일부가 그림의 전면에 등장한다면 뒤집힌 장갑의 노출된 실밥이 주는 것과 비슷한 기이함이 눈앞에 그려지게 될까? 이 질문의 대답으로 치바 마사야(Masaya Chiba, 千葉正也)의 그림을 눈앞에 가져와 본다.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위한 레퍼런스 이미지가 그림 뒤 보이지 않는 괄호로 머물지 않고, 괄호 밖을 뛰쳐 나와 자신을 마구 드러내기를 원할 때, 작업실이 작가가 그림을 그리는 물리적인 장소로만 기능하지 않고 그림 속으로 파고 들어가 공간을 트고자 했을 때,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떠받치고 선 캔버스 뒷면의 숨은 공신으로서 레퍼런스 이미지, 임시 구축물, 작업실 등이 아니라 그 모두가 캔버스의 앞면에 등장하고자 할 때, 이 모든 순간의 실현으로 치바 마사야의 그림은 새로운 시각적 유희를 펼쳐 보인다.
치바 마사야는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 있어 조금 번거롭게 보일지도 모를 방법을 택한다. 그는 그림의 어떤 구도를 상상하고 이를 캔버스로 옮겨내는 간편한 방법을 취하기보다, 그림을 그리기에 앞서 작업의 재료가 되는 사진을 출력하고, 손을 더듬어 개별 재료가 되는 조각 형태의 조형물을 만들고, 앞선 모든 재료들을 그러모아 임시 구축물을 세우고 실험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치바 마사야는 앞선 모든 과정 끝에 최종적으로 구축한 설치물을 눈앞에 두고 이를 평면 캔버스 위에 붓으로 옮겨 낸다. 이때 캔버스 위에 안착하는 그림의 내용은 모두 하나의 그림을 위해 재료로 기능하던 것으로, 그의 그림은 마치 ‘그림을 위한 재료를 그린 그림’으로 보인다. 장갑 뒷면의 노출된 실밥이 시각화되었을 때 발견되는 이상한 재미처럼, 치바 마사야의 작업은 그림 뒷면에서 그림을 보조하는 일종의 실밥으로서 기능하던 재료들이 평면 캔버스 위에 노출되면서 이상하고 재미난 장면을 연출한다.
'Pork Park #5', 2016
모든 것을 밟고 선 그림
치바 마사야는 2011년 <The wonderful world I got to See Because I was alive>(ShugoArts, 2011)라는 제목으로 개인전을 열었다. ‘내가 살아 있었기에 볼 수 있는 멋진 세상’ 정도로 번역 가능한 이 제목은 치바 마사야의 작업 전반을 설명하는 문장이 되기에도 적절해 보인다. 치바 마사야는 놋뱀이나 메두사의 도상 같은 고전적 모티프에서부터 작업 당시 먹고 있던 음식과 작업 도중 사용한 아이패드 화면에 비친 웹서핑 흔적까지 모두 한 폭 캔버스 안에 담아낸다. 그림 속 재현된 사물의 기원을 따라 고무줄을 늘리다 보면 선사시대까지 그 줄이 팽팽하게 닿는데, 이는 치바 마사야가 지난 시대를 두루 휘감고 선 지금 여기, 모든 역사를 발 딛고 서 있는 동시대에 두 눈과 두 발을 가진 사람이기에 그릴 수 있는 그림이다.
또한 치바 마사야는 동시대 작가로서 스스로의 위치를 인지하며 자신의 그림이 서 있는 또 서야 할 자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할 뿐만 아니라, 매일의 생활 가운데 자신을 둘러싸고 있으며 자신이 발딛고 선 물리적 공간이 미치는 영향을 인식한다. 동시대 작가로서 가진 스스로의 위치에 대한 앞선 인식은 2011년 개인전 제목에서 드러나기 더 이전인 2006년 작업노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작업노트 한 부분에서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거의 모든 시간을 그림을 그리며 보내고, 앞선 생각은 그가 그림을 그릴 때 마음 한켠에 항상 자리잡고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라 말했다. 매순간 스스로가 그림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작업을 수행해 나가는 일은 곧 자신이 물리적으로 위치하는 곳인 눈앞의 공간, 바로 맞닿은 주변과 환경을 살피도록 이끈다. 이러한 인식을 기저에 두고 작업을 진행해 왔던 치바 마사야는 점차 그의 주변을 작업 안으로 포섭하기 시작했다.
치바 마사야는 2009년 작업에서부터 레퍼런스 이미지와 그가 세운 각종 구축물이 놓인 작업실 한켠을 작업 전면에 드러냈다. 그림의 재료로 작동하던 것들이 그림이 되기 시작한 이 시기의 작업에는 레퍼런스 이미지를 용도로 출력한 여러 장의 사진들이 가느다란 실이나 마스킹 테이프로 연결되어 붙어 있고, 작가가 작업실에서 이용했을 법한 생활용품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느슨하고도 팽팽한 구도를 이루는 하나의 구조물로 묘사된다. 2009년 작업에 등장했던 사물이나 조각들은 그의 최근 작업에서도 그 모습 그대로 재등장하거나 조금씩 형태를 바꿔서 계속해서 출현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인터넷상의 페이지를 확인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고침 버튼을 눌러야 하는 동시대에 특화된 움직임을 닮았다. 이와 같이 치바 마사야는 현실 세계의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계속해서 그림을 업데이트해 나가는 새로고침 방식의 그리기를 시도한다. 2002년부터 재료로 사용하기 시작한 손으로 빚어 만든 하얀 두상은 지금까지도 등장하며 수차례 바뀌는 배경과 매번 새로이 조우한다. 그리고 이 새로고침과 새로움의 자극은 최근 작업에서 더욱 직접적으로 그려지는데, 2016년 개인전 <Pork Park>(ShugoArts Weekend Gallery, 2016)에서 치바 마사야는 전시 일정과 장소, 약도까지 그려 넣은 신작을 선보이며 마치 타임라인으로 기능하듯이 실시간을 반영하는 정보를 그림 곳곳에 새겨 넣는다.
'Painting for Rainbows and Words', 2016
새로움의 강박
새로움에 새로움을 실시간으로 덧입는 변화무쌍한 세계 한가운데 서서 단 하나의 고정된 장면을 그려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페인터라는 존재는 얼마나 골몰하며 그림의 향방을 모색해 나갈까? 치바 마사야도 그중 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새로움의 강박 아래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른다. 오랜 회화의 역사를 다 훑고서 여전히 고정된 한 폭 그림 안에 새로운 것을 담아내야 한다는 동시대 작가이기에 가질 수밖에 없는 강박 말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어떤 그림이 새롭게 보인다면 무엇이 새롭고 어떻게 새로울 수 있을까? 이와 같은 고민은 치바 마사야의 다른 작업들과 더불어 'Let’s have an adventure' 작업을 시도할 때 더욱 두드러지게 포착된다. 회화라는 장르로 또 한 번 새롭고 재미난 것을 발견하기 위해 모험을 결심한 치바 마사야의 에너지는 수년간 그가 이룬 실험의 결과로 쌓인 일련의 작업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또 때로는 독립적으로 빛을 발한다.
'Let's have an adventure #3', 2017
사실 치바 마사야의 그림은 앞서 디디 위베르만의 글을 인용하며 가져온 뒤집힌 왼손 장갑에서 실밥이 주는 우연한 재미를 닮지 않았다. 그의 작업은 장갑으로 치자면 그것을 뒤집었을 때 얻어지는 노출이 주는 재미의 지점을 영리하게 알고, 세심한 손길을 거친 다음 노출시킨 안쪽 면이다. 곧 시각적 재미와 기이함을 일부러 의도한 뒷면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다음 단계의 새로움을 찾는다고 했을 때, 이번엔 정말 뒤집힐 의도없이 우연히 뒤집어 발견한 뒷면이 주는 기이함을 닮은 그런 그림이 되지는 않을까? 그건 그림의 형태로 구현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어떤 모습으로 눈앞에 펼쳐질까? 향후 치바 마사야가 선보일 신작은 우연히 뒤집어 발견한 뒷면이 주는 그런 기이함과 닮아 있을까?
👉이미지 제공: 슈고아츠(ShugoArts) http://shugoarts.com/en/artist/143/
'text'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도쿄특집 01 - 데이터로 보는 도쿄 전시공간 (0) | 2018.05.01 |
|---|---|
| 도쿄특집 02 - 여전히 저장되며 살아남은 캐릭터에 대하여, 스기모토 켄스케 <수십 년이나 전에 죽었다.> (0) | 2018.05.01 |
| 도쿄특집 04 - 캐릭터는 스스로를 말하지 않는다, 아이소 모모카 <내가 행한 폭력> (0) | 2018.05.01 |
| 도쿄특집 05 - 작은 파도부터 시작해보자 - 리틀 배럴 프로젝트 룸, 대표 미즈타 사야코 인터뷰 (0) | 2018.05.01 |
| 도쿄특집 06 - 떠도는 전시공간, 나오나카무라 대표 나카무라 나오 / TATARABA, 타타라 타라 인터뷰 (0) | 2018.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