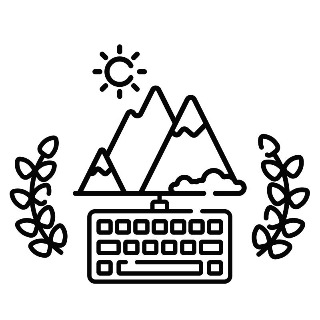이제는 익숙해진 세부와 조합, 마이클 크레이그-마틴 <All in All>
이제는 익숙해진 세부와 조합
마이클 크레이그-마틴 <All in All>, 2017.09.21. - 11.05
글 콘노 유키 (Yuki Konno)
생활용품을 고를 때, 그것이 제공하는 편이를 생각하고 카트에 담는다. 그렇지만 물건은 쓰임새를 통해서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지는 않는다. 세련된 디자인, 색깔의 조화를 보고 사람들은 물건을 구입한다. 무엇 때문에? 색감과 형태가 주는 매력 때문에 볼펜을 하나 구입했다. 그것을 책꽂이 옆, 머그잔과 핸드크림 뒤에 있는 연필꽂이에 꽂는다. 공장에서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생산된 볼펜이 이제 여태까지 못 본 존재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뜻하지 않은 만남은 마치 요리를 하면서 갖가지 재료를 쓰는 것처럼 이제는 사람들 눈에 조화롭게 비추어진다.
영국 작가 마이클 크레이그-마틴(Michael Craig-Martin)은 일상생활 속 물건을 모티프로 회화작업을 하는 작가이다. 그의 전시 <All in All>가 지난 9월 21일부터 서울의 갤러리 현대에서 열렸다. 같은 전시공간에서 2012년에 그의 개인전 <WORD . IMAGE . DESIRE>이 열렸는데, 그 당시 공개된 작업과 비교하면 상당히 차이가 있다. 2012년에 소개가 된 일련의 회화 작업을 보면 글자와 일상의 사물이 캔버스 안에 복잡하게 그려져 있다. 윤곽선으로 처리된 사물과 언어(단어)는 서로 얽히면서 캔버스의 공간을 빽빽하게 만든다. 이번에 소개가 된 작업은 일상생활용품이 그려져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사물들을 과밀하게 배치하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갖는다.
전시장에 걸려 있는 작업 중에서 눈길을 끈 것은 다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세로로 길게 뻗은 작업이다. 여기서 프레임의 대칭적인 비율 때문에 대상은 온전히 캔버스 안에 그려지지 않고 단편적으로만 그려진다. 옆에서 본 노트북의 모서리 부분, 우산의 손잡이에서 뻗은 일부분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어서 사물의 전체 모습이 캔버스 안에 드러나지 않는다. 혹자는 그 단순한 선과 색깔 처리가 특이한 캔버스의 형태와 어울리면서 바넷 뉴먼(Barnett Newman)의 차가운 색면 추상을 떠올릴지도 모른다. 또 다른 사람은 사물의 특정 부분을 포착하였다는 점에서 알베르트 렝거-파취(Albert Renger-Patzsch)의 신즉물주의 사진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캔버스의 비율과 그에 맞게 그려진 일상용품은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의 조합을 보여주는 듯하다. 디자인의 디테일에 드러나는 아름다움은 사람들을 매혹시킬 가치로서 나타난다.


또 다른 한 가지는 'Common Place'라고 이름 붙여진, 사물을 캔버스 안에 여러 개 배열하는 작업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배치는 이전 작업에 찾을 수 있는 혼잡한 장면도 ‘사물의 전면성의 원리’에 기반하여 그려진 것도 아니다. 'Common Place'에서 사물의 전체상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한 눈에 무엇을 그렸는지 파악하기 힘든 각도로 그려졌다는 점에서 이전 작업과 차이를 갖는다. 캔버스 공간에 놓여진 여러 사물은 각각의 거리를 유지한 채 하나의 장면을 구성한다. 노트북이 스마트 폰보다 작게 그려지고, 스마트 폰보다 실제로는 훨씬 큰 의자는, 캔버스에 크게 그려진 스마트 폰의 전면지배를 말리듯이 캔버스를 수평으로 가로지른다. 이처럼 물건이 실제 크기와 달리 표현되었고 각각의 사물이 포착된 시점이 다르다는 점에서, 이 작업은 하나의 콜라주 작업과 같다. 그것은 마치 선대 작가의 리처드 해밀턴(Richard Hamilton)이 표현한 일상의 모습에 에두아르도 파올로치(Eduardo Paolozzi)의 화려한 색채를 곁들인 것으로 보인다.


다른 시각에서 바라본 사물들의 만남은 또 다른 콜라주의 전통을 상기시켜준다. 그것은 바로 초현실주의자들의 작업이다. 막스 에른스트(Max Ernst)의 콜라주가 그렇듯이 애초에 그것은 인간의 숨겨진 욕망을 드러내는 방법이었다. 오늘날 콜라주에 나올 법한 뜻하지 않은 만남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더 이상 그 조합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 그것은 건축가 렘 쿨하스(Rem Koolhaas)가 『착란의 뉴욕(Delirious New York)』과 에세이 「더 제널릭 시티(Generic City)」에서 분석한 것처럼 헬스장 바로 아래 층에 식당이 있거나 도심에 불교사원이 있어도 더 이상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게 되었다. 이전의 크레이그-마틴의 작업에서 나타난 이러한 조합의 관계가 과밀함 속으로 은폐되어 있었다면, 최근작은 재현된 사물들의 거리감을 통해 우연한 배치 속에 숨은 소비욕망을 드러내주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사물 바라보기의 두 가지 방식, 클로즈업과 배치를 통한 거리 두기는 현실세계와 비현실의 관계를 모호하게 놓는다. 시각적으로 볼 때 사물의 일부분만 보이는 회화는 일부분만 강조하여 확대한 나머지 실물을 볼때와 다른 인상을 준다. 이것은 오늘날 아이폰의 모서리에 대한 페티시즘으로서, 사물의 특정부위가 (보다 광범위한) 소비로 이끄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배치된 사물들을 통해 우리는 앙리 루소(Henri Rousseau)의 환상적인 정글의 장면을 닮은, 현실 세계의 사물들의 조합을 보여준다. 스마트 폰과 의자, 그리고 볼링 공의 어우러짐은 일상 생활에서 더 이상 이상한 조합으로 여겨지지 않게 되었다. 콜라주로서 드러난 욕망, 그것은 현실 세계에서 더 이상 환상마저 소비를 통해 실현되듯이 말이다.
'text'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건축전시-되기, <종이와 콘크리트> (0) | 2017.10.16 |
|---|---|
| 디지털 환경에서 살아가기, 안광휘 <the pathetic rhymes> (0) | 2017.10.16 |
| 두 개의 은하가 만나는 순간, 양아치 <When Two Galaxies Merge,> (0) | 2017.10.16 |
| 여기까지가 예술~사진, 압축과 팽창 <허니 앤 팁> (0) | 2017.10.16 |
| 다른 시공간의 이미지를 엮어내기, 김익현 <Looming Shade> (0) | 2017.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