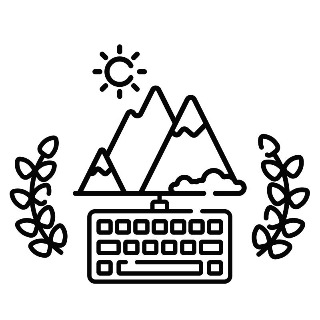몸 바깥의 몸, 김윤익 <포유류 대장간>
몸 바깥의 몸
김윤익 <포유류 대장간>, 공간 사일삼, 2018.7.14 - 7.29
글 이상엽
유토피아적인 몸
“이제부터 당신은 이 게임 속 대장간의 주인이 됩니다.” 대장간을 운영하는 대장장이를 모티브로 한 모바일 게임의 시작 화면에서는 앞선 문장이 제시된다. 시작 버튼을 누르면 그럴싸한 대장간과 함께 무기나 연장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무상으로 제공된다. 게이머는 땀 흘려 기술을 익히지 않아도 이미 숙련된 대장장이가 되어 있다. 게임 속 용광로의 쇳물은 몇 초만에 펄펄 끓고, 게이머가 액정 화면에 가하는 가벼운 터치 몇 번이면 금세 빛나는 칼 한 자루가 생겨난다. 대장장이 탈을 쓴 게이머는 몸에서 한없이 자유롭다. 아무리 일 해도 땀이 흐르지 않고, 과로에 시달려 몸져 누울 일 없고, 무엇을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씻지 않아도 냄새나지 않고, 달마다 대장간으로 날아드는 고지서에 머리가 지끈거릴 일도 없다.
앞선 게임 액정 속 대장간의 주인인 대장장이가 소유한 몸은 어쩌면 모바일 게임이 탄생하기 훨씬 더 이전에 미셸 푸코가 『헤테로토피아Les Hétérotopies』의 「유토피아적인 몸」에서 꿈꾸었던 이상적인 몸과 들어맞을지도 모른다. “유토피아, 그것은 모든 장소 바깥에 있는 장소이다. 한데 그것은 내가 몸 없는 몸을 갖게 될 장소인 것이다. 아름답고, 맑고, 투명하고, 빛나고, 민첩하고, 엄청난 힘을 지니고, 무한히 지속되고, 섬세하고, 눈에 띄지 않고, 보호되고, 언제나 아름답게 되는 몸 (...) 그것은 바로 형체 없는 몸의 유토피아일 것이다” 푸코에게 자신의 몸은 유토피아의 정반대인 가차 없는 장소이며, 스스로에게 강요된 어찌할 수 없는 장소였다. 푸코는 인간이 몸이라는 장소에 맞서기 위해, 그리고 이 장소를 잊기 위해 모든 유토피아를 탄생시켰다고 보았다. 그가 말하는 유토피아적인 몸은 바로 자신의 몸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몸이었다.
그런데 모바일 게임 속 대장장이가 가진 몸은 실제 몸 바깥에서 정말 자유로울 수 있을까? 투명하고, 빛나며, 민첩하고도, 무한히 지속 가능할까? 푸코의 상상과는 반대로 우리의 몸이 모바일 게임에 최적화된 몸으로만 작동하게 될 때 점차 무뎌지는 신체 감각은 오히려 그리운 감각이 되어가는 건 아닐까? 몸에서 자유로워질수록 몸을 그리워하게 되는 모순으로. 한 뼘 크기 액정 화면에 손가락 두어 개를 적당히 놀려 손에 쥘 수도 없는 빛나는 무기를 수도 없이 만들어내다 보면, 그저 열 손가락 전체 감각이 온전히 느껴지도록 물체를 주무르고 두들겨 요리조리 만질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은 욕구가 솟아오르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몸은 모바일 게임 속 자유로운 신체 바깥에서 절대 무감각해지거나 무뎌질 수 없다. 게임이 진행되는 중에도 게임 바깥의 몸은 끼니마다 배꼽시계가 울고, 더위와 추위를 타며, 씻지 않으면 냄새나고, 쉽게 피곤에 휩싸이고, 두통에 시달리는데, 이렇게 몸이 끊임없이 반응하는 실제 상황 가운데 게임은 유예되거나 중단된다.
상태창~덩어리~캐릭터
김윤익은 모바일 게임을 가동시키는 감각과 게임 바깥에서 삶을 영위하는 실제 몸 사이 분리되지 않는 감각과 경험을 <포유류 대장간>이라는 이름을 붙여 전시 형태로 구현했다. 작가가 선보인 작업들은 상태창, 덩어리, 캐릭터라는 세 개의 단어가 서로의 앞뒤를 무는 고리로 엮여 함께 작동한다. '상태창~덩어리~캐릭터'의 연동은 가상과 현실을 오가는 감각이자 전시에서 개별 작업을 묶어내는 공통 단어로 기능한다. 먼저 상태창은 롤플레잉 게임(RPG)에서 사용되는 단어로 게임 캐릭터의 상태를 보여주는 창이다. 상태창에서는 캐릭터의 레벨과 스킬, 현재 상태, 소유한 무기와 아이템 등의 내용이 정리되어 캐릭터를 세세히 설명한다. 그중에서 캐릭터가 소유한 아이템이나 장비는 박물관 진열장에 전시된 유물들처럼 규격화된 정사각형 틀 안에 각각 비치되어 있다. 김윤익은 게임에서의 상태창을 모티브로 이를 변형시켜 입체화해 전시장에 옮겨왔다. 전시장에 설치된 입체화한 상태창은 박물관의 진열장, 동시대 미술관의 설치 구조물 일부, 여느 브랜드 매장의 쇼룸, 이케아의 상품 진열대 등을 두루 아우르는 구조물로 보인다. 그런데 입체화된 상태창의 앞뒤양옆으로 안착한 작업들은 하나같이 형태가 불명료하고 모호한 생김새를 지녔다. 게임 속 상태창에 비치된 아이템들이 칼이면 칼, 장갑이면 장갑, 묘약이면 묘약 등 그 기능과 형태, 용도가 외관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데 반해 김윤익의 상태창에 놓인 덩어리들은 그 기능과 형태, 용도를 도무지 알 수 없는 추상적인 모양새를 가졌다. 게임 속 캐릭터의 상태창을 열면 곧바로 캐릭터의 면면을 파악할 수 있는 것과 다르게 <포유류 대장간>에 펼쳐진 작가의 상태창에서 작가의 상태는 단번에 알 수 없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그 모호한 상태창을 통해서 그의 상태를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 김윤익의 작업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형태의 모호함은 그가 가진 상황과 조건 그 자체의 모호함과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있다. 김윤익은 그의 이전 작업을 설명하면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언급한 바있다. 그는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는 개인으로서 느끼는 커다란 심리적 낙차, 경외심, 기시감, 소외, 무기력함과 같은 감정 혹은 느낌'을 작업에서 비선형적으로 담아내는데, 김윤익이 구현한 작업물의 형태가 모호한 이유는 그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몸과 기억 속에 잔여물처럼 조각나고 뒤엉킨 채로 남은 경험의 덩어리들이기 때문이다. 작가가 모바일게임 속 가상 공간과 그 바깥 세계인 현실을 수차례 오가는 동안 새로 축조되거나 잘게 부서져 뒤엉킨 경험의 더미들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상태창~덩어리~캐릭터' 이 세 단어의 고리가 엮일 때만 가능한 것일지도 모른다.
번영과 쇠락
전시 제목인 ‘포유류 대장간’은 잊혀지거나 사라져가는 감각이나 공간을 은유한 단어의 조합으로, ‘포유류’는 갈수록 희박해져가는 몸의 감각을, ‘대장간’은 사라져가는 장소 또는 거의 가상화되어버린 실재했던 것을 의미한다. 김윤익은 이 낯선 조합의 이름으로 무엇을 소환해오고 싶었던 걸까?
가령 '대장간'은 특정 산업의 번영과 쇠락을 소환해올 수 있다. 아주 옛날 각 마을마다 농기구나 연장을 만들어 팔고 수리하던 전통적인 대장간은 이후 기계화된 환경에 걸맞는 몸체인 철공소와 제철소로 대체/확장되었고, 이 철강산업의 번영은 1970-80년대 문래동 일대에서도 진행되었다. 번영하는 것은 언젠가 쇠락하기 마련이고, 이와 마찬가지로 쇠퇴한 산업은 그 산업이 작동시키던 개별 공장의 쇠퇴와 직결된다. 공간사일삼은 그렇게 산업이 쇠퇴한 자리인 빈 공장에 작업실과 전시공간을 틀었다. 아주 옛날 대장장이가 대장간에서 연장을 만들어 팔던 감각으로 작가는 전시공간에서 손수 만들어낸 작업을 전시한다. 현실에서 사라져가는 공간과 업으로서 대장간과 대장장이는 가상 공간인 게임 속으로 터를 옮겨 이주하여 모바일 속 주요 공간과 캐릭터로 자리 잡았다. 대장간과 대장장이는 이제 현실세계가 아닌 가상세계에서 실현가능하고 또 익숙한 공간과 캐릭터로 존재한다. 전시에서 김윤익이 스스로를 '대장장이'라 칭하며 현실에서 사라져가는 것을 다시 붙잡고 소환하려는 것은 어쩌면 그 희미하고 불확실한 지위에 자신을 이입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사라져가는 지위와 상태로서 '대장간'과 더불어 '포유류'는 가상세계에 치우치면서 희미해져가는 몸의 감각을 다시금 새롭게 일깨우고자 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김윤익은 그의 두 번째 개인전이었던 <세계의 바깥>(공간 사일삼, 2015)에서 사회를 향해 벌이던 개인의 지난한 사투 속에서 끝내 상쇄되지 않는 한 가지를 발견한다. 그건 바로 자신이 가진 육체에 대한 인지였다. 전시 서문에는 다음의 문장으로 이를 설명한다. "'나'라는 존재의 무의미에 대해서 사유하게 될 때도 완전히 벗겨낼 수 없는 것이 있다. 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 부피, 육체성은 무의미함 속에 당당하게 자리한다." <세계의 바깥>에서 전시되었던 'Pieces'(2014) 연작은 작가가 버리지 못한 물건들로 뭉친 덩어리 조각들로 존재의 무력감과 무의미 속에서도 당당하게 자리하는 작가의 육체를 대변한다. 자신의 육체에 대한 고찰은 그의 세 번째 개인전이 된 <포유류 대장간>에서 그리워진 몸의 감각으로 재등장한다. 그것은 현실을 압도하는 것만 같은 가상의 번영 가운데 쇠락해가는 몸의 재번영을 그리는 일일 수도 있다.
사진 제공: 김윤익
'text'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별자리'로 그은 선, 2018 광주비엔날레 <상상된 경계들> (0) | 2019.01.14 |
|---|---|
| 빛 바랜 시선: 사진을 보기에 대해서, 김보리 <사진찍어줄게요: 오프라인> (0) | 2018.09.05 |
| 재료로서의 이미지, 방법론으로서의 프로그램 : 선셋밸리 이미지 시뮬레이터 (0) | 2018.09.03 |
| 전시들, <Exhibition of Exhibition of Exhibition> (0) | 2018.06.27 |
| 갤러리 공간에 대한 사고 실험, <포인트 카운터 포인트> (0) | 2018.06.25 |